[문학의 지형]...이수경 <자연사박물관>

"그녀는 똑같은 모양의 백금 결혼반지 두 개를 팔았다. 보석상 주인은 얼마간의 돈을 건네주고 그들의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거리로 나왔을 때, 참고 있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삶의 어떤 순간을 낯선 곳에 버려두고 떠나온 것만 같았다."- 이수경, '카티클란의 불빛' 중에서안토니오 타부키의 소설 <인도 야상곡>에는 “죽어가는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두 배 이상 커지면, 그 별은 수축을 저지할 수 있는 물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서 무한대로 수축이 진행되고 그 별에서 방출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블랙홀로 변한다“라는 문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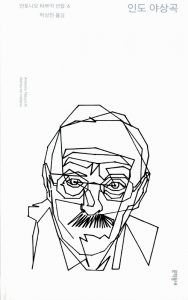
"그는 아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해나 사랑 따위는, 추운 겨울밤, 먹지 못할 닭똥집을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철탑이나 고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지상에서의 선택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 - '자연사박물관' 중에서7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소설집 <자연사 박물관>은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나머지 6개의 단편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다시 쓰기'이다.'다시 쓰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텍스트 간의 긴밀한 연결성이 하나의 작품처럼 생각되게 하는 것이 장점이자 매력이기도 하다.그래서 각 단편들은 그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들을 위해 존재하고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감정이 더 이입된다.예를 들어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단편이 한 장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그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피사체와 그 피사체에 따른 이야기들을 좇아가는 과정이다.따라서 이 소설 속에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겁에 질리는 화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동생과 몰래 다락방으로 숨어들어 소리가 날까 봐 라면을 씹지도 못하고 우물우물 녹여먹던 화자, 재이와 함께 베란다에 차오른 물을 퍼내고, 누군가 버려둔 소파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멀쩡하다는 이유로 거실에 두고 잠까지 청하는 화자, 그리고 해고 노동자의 아내로 남루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화자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나'로 생략되거나 반복된다.

"이 파도가 지나가면 또 어떤 세상이 올까요?"©문학뉴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