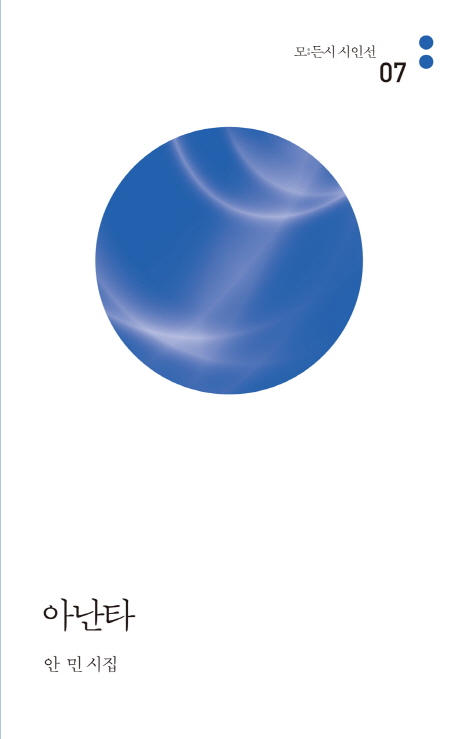
[문학뉴스=남미리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로 시인을 꼽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반드시 외로움을 느껴야 시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시편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로 바꿀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
안민(본명 안병호) 시인이 최근 모:든시 시인선으로 펴낸 시집 『아난타』(세상의 모든시집 펴냄, 1만 원)의 작품들도 그렇다. 스산한 삶을 살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허물어지고 있는 세상, 더욱 고립되는 존재들을 보여주면서 비교 우위의 감정으로 삶을 버텨내라고 다그치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읽으면 바람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 정해진 방향 없이 항상 나부끼며 정해진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
시인도 시집 앞머리에 “우주가 한 점보다 더 외롭고/ 희미했을 때부터/ 나의 始原은 겨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쓴 ‘자서’처럼 꽁꽁 얼어붙은 겨울 벌판에서 가야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기혁 문학평론가는 시집 말미에 실린 해설 <낭만주의적 신체와 불화의 윤리학>에서 시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몸을 버린 우직한 주먹” “세상에서 제외된 등을 위해” “나를 배반하는 손” 등 분절된 신체의 이미지들이 시적 자아의 온전한 몸을 대신해 세계와 만나서 불화를 겪고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소통의 부재를 실감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적 주체는 소통에 대한 열망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타자에게도 가 닿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얻게 된 그 외로움의 실체를 찾아 지도에도 없는 행선지를 찾아 떠나는 시인은 낭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지 모른다.
시인은 작품을 위한 몇 가지 실험도 하고 있다. 첫 작품 <눈사람>에선 시행 진열을 눈사람 모양에 맞게 배열함으로써 ‘보는 시’로 만들었고, 일부 작품에선 보통어와 존대어를 섞어 씀으로써 마주하고 있는 상대와 말을 주고받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아난타’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이다.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부처를 모시면서 부처의 말씀을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단어 자체는 기쁨과 환희를 나타낸다. 시집에 실린 작품 중 표제작이 없어 ‘아난타’라는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 다소 궁금해진다. 과연 시인은 열심히 들으려는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보이려는 것일까. 판단은 시집을 읽은 독자의 몫이겠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안 시인은 2010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을 받았고, 제18회 부산작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게헨나』가 있으며 현재 부산작가회의 회원이다.
<해당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나는
바람이 부니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있을 뿐
통증은 190에 120
오래 함구하던 상처처럼
해변에서 태어났고 해변에서 경계를 넘고 있다
붉은 울음이 들려온다
울음이 혈관을 찢는다
내 몸의 가시가 내 눈을 찌른다 나는
나를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말기였고
모래인 줄 알았는데 바위였다
눈물인 줄 알았는데 폭우였고
정말이지 뇌출혈인 줄 알았는데 우울이었다
모든 게 경계 넘어 악성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무덤입니까
다음 계절 쪽으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흐린 허공에서 칼날이 쏟아진다
바다는 흐느끼고
nib503@munhaknews.com
©문학뉴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